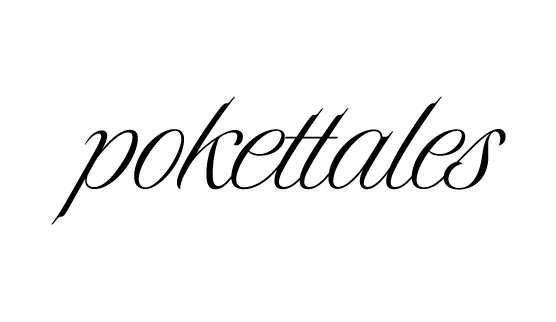Saehan Parc
| Oops, It Has a Name Now

사이에서 생겨나는 작은 진동들
박새한의 그림은 언제나 ‘설명되지 않은 세계’에서 시작된다.
말로는 끝내 닿지 못하는 장면들, 이름을 갖지 못한 사물들, 그리고 서로를 향하지만 맞닿지 않는 관계의 결들이 그의 시선을 오래 붙잡아왔다. 작가는 그 틈에서 생겨나는 미세한 떨림을 포착해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감각에 가까운 움직임이며, 오해가 길을 열어주는 조용한 세계다.
그의 화면은 작고 느린 곡선으로부터 시작된다. 타원은 처음엔 얼굴일 수도, 나사일 수도, 혹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 정해지지 않은 상태는 작가에게 하나의 숨구멍처럼 작동한다. 선이 방향을 잃으면 그는 기꺼이 그 오해를 따라가고, 도형이 숨을 곳을 찾지 못하면 다시 그 곡선을 품어 안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들은 디지털 벡터처럼 정확하면서도, 종이 위에서만 가능한 흔들림과 온기를 동시에 품는다.
을지로에서 시작된 연작과 Zine 「나사식」은 작가가 바라본 세상의 뒷면 같은 장면들이다. 쏟아져 나온 녹슨 쇳덩이,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모를 잔해의 집합, 오래 버려져 있던 나사들은 작가에게 알 수 없는 서늘함과 동시에 묘한 친밀감을 남겼다. 그는 그 장면 속에서 자신이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쳐온 감정들을 다시 떠올렸고, 나사와 사람 사이의 긴 시간을 종이 한 장에 불러오듯 조심스럽게 마주 앉혔다. 두 존재는 같은 페이지 위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면서도, 어쩐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표정을 띤다.
이번 전시는 그렇게 모여든 장면들; 오해에서 비롯된 선, 미정의 얼굴, 사물과 사람이 뒤섞인 숨결, 그리고 그 모두가 품고 있는 작은 진동을 하나의 긴 여정처럼 펼쳐 놓는다. 작품들은 설명보다 감정으로 다가오며, 관람객은 그림 속에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기억의 파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전시는 결국, 우리가 스쳐 지나가며 놓치고 있던 것들이 아주 작은 떨림으로 다시 다가오는 자리다. 박새한의 세계는 그 진동을 조용히 드러내고, 관람객은 그 속에서 자신만의 오해와 이해, 그리고 아무도 붙이지 않은 새로운 이름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Where Small Vibrations Begin
Saehan Parc’s drawings always begin in a world that resists explanation.
Scenes that language cannot quite hold, objects that never acquired a proper name, and relationships that reach toward each other without ever touching these are the fragments that stay with her. From those fragile gaps, the artist gathers subtle vibrations and lays them gently onto paper. What emerges is not an act of understanding but a movement closer to sensation; a quiet world in which misunderstanding becomes a path rather than an obstacle.
Her images begin with small, unhurried curves. An ellipse may become a face, a screw, or nothing at all. This uncertainty acts as a kind of breathing space within the work. When a line loses its direction, she willingly follows its mistake; when a shape cannot find a place to settle, she embraces it again. The resulting lines hold the precision of digital vectors, yet they carry the tremor and warmth that only paper can contain.
The Euljiro series and the zine 「Nasasik」 reveal the reverse side of the world she has been observing. Rusted metal spilling out of an open junk shop, tangled remnants that refuse to be read, screws long stripped of their purpose these scenes left her with a chill that felt strangely intimate. Within these encounters, she returned to emotions she had never fully articulated, seating screws and people across from each other on a single sheet of paper, as though collapsing the long stretch of time that separates them. On the same page, these two beings inhabit different timelines, yet appear to exchange a quiet glance.
This exhibition gathers such moments ines born from misunderstanding, faces suspended in uncertainty, breaths shared between people and objects, and the small vibrations held within them and unfurls them like a slow, continuous journey. The works approach the viewer not through explanation but through feeling, inviting each person to discover a fragment of memory they had not realized they carried.
In the end, this exhibition is a place where things we once brushed past return as the faintest tremor.
In Saehan Parc’s world, that vibration is gently revealed, offering the viewer a space to encounter their own misunderstandings, their own attempts at understanding, and perhaps a new name that no one has yet spoken.
Artist’s Statement
나는 그림을 그리고, 만화와 그림책을 만들며, 때때로 진(zine)을 만든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이해받지 못한 채 지나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나는 때때로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하나의 지평선을 이루는 장면을 떠올리고, 그 앞에서 멍하니 머문다. 그리고 그 지평선 속에서 무언가를 이해하려다 생겨난 작은 오해들을 모아 종이 위에 옮긴다.
이 과정은 어떤 사물을 만났을 때 그 본질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어낸 이름을 붙이고, 나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일과 닮아 있다. 한 사물이 여러 이름을 동시에 지닐 수 있듯, 한 번 그려진 타원형 역시 다양한 이름과 역할을 오가며 관계를 바꾸고, 결국 한 장의 그림 안에서 이야기를 결정짓는다.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즉흥적으로 흘러가는 사고를 기하학적 도형으로 조절하며,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종이에 안착시킨다. 얇고 일정하게 그어진 선은 디지털 벡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옅은 마커 채색은 종이의 질감과 함께 엮이며 손으로 만든 장면의 온기를 남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어온 작업 중 하나가 2025년 10월 갤러리 포켓테일즈에서 상주하며 그린 ‘을지로 연작’이며, 이후 독립출판물 「나사식(Nasasik)」으로 완성됐다. 「나사식」은 2020년부터 시작한 그림과 제목만으로 구성된 24쪽 zine 시리즈의 일곱 번째 작품으로, 을지로에 버려진 나사들과 버린 사람들을 한 페이지 안에서 마주하게 한다. 한때 무언가였던 나사들과 그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얇은 종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응시한다.
I draw, make comics and picture books, and occasionally create zines.
In this world, countless things occur that cannot be understood, and just as many pass by without ever being understood. At times I imagine these moments piling up until they form a kind of horizon, and I find myself standing before it in a daze. From within that horizon, I gather the small misunderstandings born from trying and failing to comprehend something, and I place them onto paper.
This process resembles the way I relate to objects: regardless of their original nature, I give them names of my own, forming 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m. Just as one object can hold multiple names at once, a single ellipse I draw moves between different identities and roles, shifting relationships until it eventually settles into the story of a picture.
When I draw, I temper the spontaneity of my thoughts with geometric shapes, gradually anchoring the narrative onto the page. The thin, consistent lines may resemble digital vector imagery, yet the soft marker tones bind the drawing to the texture of the paper, leaving behind the warmth of something made by hand.
One of the works created through this process is the Euljiro Series, produced during my residency at Gallery Pokettales in October 2025. It later developed into the zine 「Nasasik」, the seventh in a 24-page series composed only of drawings and titles that I began in 2020. In Nasasik, the discarded screws of Euljiro meet the people who have also been cast aside, facing one another on the same page. Once-particular screws and the people lingering in their own in-between states gaze at each other across the thin sheet of paper.
Q&A with Saehan Parc 박새한
Q: 작가님 작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이해받지 못한 것들”은 어떤 감정에서 출발하나요?
A: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곤 했었어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그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층위에서, 저 자신이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의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국을 떠나 사는 이방인이라서인지, 아직도 자신을 설명하는 일에 서툴러서인지, 매일 그런 순간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그 이유를 이해하고픈 욕심도 공연히 더 커지고, 저와 같이 이해받지 못한 처지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더 쓰이는 것 같아요.
Q: 작가님이 말하는 ‘오해를 수집하는 일’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시각적 모티브로 번역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A: 즉흥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결과물을 읽어내려고 하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이 타원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나사못이었나? 그러면 오해가 이끄는 대로 그림의 방향을 틀어요. 그림에 따라서는 이 과정을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기도 합니다. 혹은 일상에서 만난 오해를 그림으로 가져와서 직설적으로 풀어놓기도 해요. 전철역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는 사람들을 그린 거울 그림이나,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숲 그림처럼요.
Q: 작가님 작업에서 반복되는 ‘타원형 인물’은 언제 처음 등장했나요? 특정 사건이나 관찰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혹은 자연스럽게 정착된 건지 궁금합니다.
A: 처음에는 지금과 같은 타원형 모양자가 아닌 운형자를 사용했었어요. 패션, 건축 분야에서 도안을 그릴 때 쓰는 도구인데 어린 시절 만화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이걸 쓰는 법을 익힌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고전적인 만화 문법을 익히면서, 액션 만화 등에서 등장인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선을 운형자로 그리는 법을 배웠었거든요. 그 후에는 운형자로 거의 모든 그림을 그렸어요. 나중에 프랑스 유학 중에, 옛날에 사용하던 방법과 도구들을 다시 써보다가 이걸 다시 사용하게 됐는데, 우연하게도 영문 이름이 French curve더라구요. 그러다가 작은 곡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씩 모양자를 섞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후로 타원이 점점 자주 나타났고, 지금은 그림 대부분이 타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네요.
Q: 타원을 그릴 때 ‘이것이 무엇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미정성이 작가님에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뭐든지 하는 일을 재밌게 잘 해내기 위해서는 과정의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미정성이 숨통을 조금 틔워주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결과물에 미정성을 심어놓는 것도 좋아합니다. 모든 모호함을 걷어내지 않고 어느 부분은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겼을 때 새로운 오해가 싹트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모호함과 거리가 먼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안에 오해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아요.
Q: 즉흥적인 사고의 흐름을 기하학적 도형으로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그 제한이 작가님에게는 방해인가요, 아니면 더 큰 자유를 주는 장치인가요?
A: 꼭 필요한 방해인 듯합니다. 작업 과정을 떠올려보면, 생각을 도형이 제한하면 또 다른 길을 찾아 새어나가고, 그것을 또다시 도형으로 담아버리는 과정이 그림이 끝날 때까지 반복되는, 두 편이 나뉘어서 하는 줄다리기 같은 느낌을 받아요.
Q: 디지털 벡터 같은 선을 의도적으로 ‘손으로’ 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술적 선택에 대한 작가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A: 20대 때 프랑스의 라인고등예술학교(HEAR)에서 공부했는데, 뭐든지 손으로 직접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작업도 자연스럽게 종이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디지털만으로 작업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종이가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래도 디지털 작업의 잔상이 남아 윈도우 그림판으로 그린 듯한 선을 종이에 새기고 있긴 하지만요. 저는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사절지 종이에 연필과 지우개를 비벼가면서 배워서 그런지, 종이에 작업할 때 비로소 제대로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Q: 이번 을지로에서 새로이 작업한 「나사식」이라는 Zine의 제목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A: 나사식이란 기계의 조립 등에 나사를 사용했음을 이르는 말인데요. 갤러리에서 작업하던 첫날, 그렇게 사용되었다가 버려진 나사들을 주변 철물점들을 돌아다니며 주워 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Zine의 뒤표지에 있는 나사들을 그렸습니다. 그 후에 그 나사들을 마주 보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그려 넣었고, 그림 작업 과정과 같이 책 안에서도 그 둘을 하나씩 만나게 하며 책을 완성했죠. 그렇게 나사에서 온 책이기에 나사식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의미로는, 쓰게 요시하루의 “나사식”이라는 단편 만화에 대한 작은 오마쥬이기도 해요. 제가 만화를 공부하고나서 웹툰이나 장편 만화가 아닌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하게 된 데에는 어릴 때 이 작품을 만났던 일이 일정 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올해 한국에 돌아와 첫 개인전을 준비하며 저의 몇 가지 시작점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이때 떠오른 작품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Q: 을지로라는 동네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A: 첫날 나사를 주우러 다니다가, 문 없는 고물상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와 길에 널브러져있던 녹슨 쇠뭉치들을 목격했던 순간이 기억나요. 도무지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 두꺼운 책, 그런데 모든 페이지가 구겨진 책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왜 저 쇠사슬들은 저기에 누워있고 나는 여기에 서서 숨 쉬고 있는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Q: 나사와 사람을 ‘종이 한 장 사이에 둔 두 존재’로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 나사와 사람이라는 두 존재 사이를 가르는 건 길고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겁의 시간을 불러와 종이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게 만화이고, 그런 만화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Zine이라고 믿기에 이렇게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Q: 이번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면 좋을까요?
A: 전시된 많은 이미지 중에서 관람하시는 분의 마음에 드는 그림 딱 하나가 마음에 박혀서, 그 장면을 기억에 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가님에게 그림 그리는 일은 설명하기 위한 행위인가요, 아니면 설명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언어인가요?
A: 저의 의도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좋고 오해를 사도 좋으니, 이 이상 설명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언어입니다. 마음껏 오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Q: The “inexplicable things” and “misunderstood moments” that appear in your work—what emotions do they stem from?
A: I’ve always been a curious person, asking far more questions than I could answer. Perhaps that’s why the world feels full of things I can’t quite understand. But on a more personal level, I think it comes from moments where I myself felt misunderstood by others. Living abroad as a foreigner, and not being very good at explaining myself, I encounter such moments almost every day. The more it happens, the more I want to understand why—and I find myself drawn to stories and situations that share that same sense of not being fully understood.
Q: You’ve mentioned “collecting misunderstandings.” What does that process look like? How does it translate into visual motifs?
A: When I try to interpret what’s happening during spontaneous drawing, misunderstandings inevitably occur. Sometimes I’ll look at an ellipse and wonder, “Was this supposed to be a face—or a screw?” When that happens, I let the misunderstanding redirect the drawing. Depending on the work, this back-and-forth can continue until the very end. Other times I bring misunderstandings from daily life directly into the drawings—like the mirror piece of people fixing their makeup in a subway restroom, or the floating forest suspended in the sky.
Q: When did the oval-shaped figures, which appear so often in your work, first emerge? Were they inspired by something specific, or did they form naturally?
A: At first, I didn’t use the ellipse template I use today, but a French curve. It’s a tool used for drafting in fashion and architecture. I learned how to use one when I started attending a comic academy as a child, especially for drawing motion lines in action scenes. For a long time I drew almost everything with a French curve. Later, while studying in France, I revisited some of the methods and tools I used in childhood and began using it again only to realize that its English name is literally “French curve.” Eventually, as I began mixing different templates to draw smaller curves, ellipses started appearing more frequently, and now most of my drawings are composed of them.
Q: You’ve said that an ellipse begins in a state of “not yet being anything.” What role does that indeterminacy play for you?
A: To enjoy the work and do it well, I think the process has to be fun. When I’m working on illustration as a tool to communicate a specific intention, this indeterminacy gives me room to breathe. I also like leaving parts of a drawing unresolved. Not clearing away every ambiguity allows new misunderstandings to sprout, which I enjoy watching happen. So even though my drawing style isn’t visually ambiguous, I think I keep making space for misunderstanding within the work.
Q: You control the flow of spontaneous thought by containing it within geometric shapes. Is that limitation a hindrance, or does it give you a different kind of freedom?
A: It feels like a necessary kind of hindrance. When I think back on the process, it’s like a tug-of-war: the shapes constrain my thoughts, then the thoughts look for another way out, and then the shapes capture them again. This back-and-forth continues until the drawing is finished.
Q: Why do you choose to draw lines that resemble digital vectors, yet insist on making them by hand? What guides that decision?
A: In my twenties I studied at HEAR in France, which is a place where everything is made by hand. Naturally, my work shifted onto paper. There was a time when I worked entirely digitally, but now paper feels far more comfortable. Still, traces of digital drawing linger I find myself carving lines into paper that look like they were made in Microsoft Paint. I first learned to draw by rubbing pencils and erasers on large sheets of paper, so I feel truly immersed only when I’m drawing on paper.
Q: What does the title of your new Euljiro zine, “Nasasik,” mean?
A: “Nasasik” refers to using screws in mechanical assembly. On the first day of working at the gallery, I walked around the local hardware shops collecting screws that had been used and discarded. I drew those screws first, for the back cover of the zine. Then I drew people facing them, one by one, arranging their encounters inside the book just as I did during the drawing process. Since the book originated from those screws, I named it Nasasik.
There’s also a personal meaning: it’s a small homage to Tsuge Yoshiharu’s short manga “Nasasik.” That work influenced me when I was young and played a part in why I create the kind of drawings I do now, rather than working in webtoons or long-form comics. Preparing for my first solo exhibition in Korea made me revisit some of my early starting points, and that piece resurfaced for me.
Q: What was the most striking scene you encountered in Euljiro?
A: On the first day, while collecting screws, I came across a pile of rusted metal spilling out of a junk shop with no door. It felt like facing a thick book with every page crumpled and impossible to read. I remember standing there, unable to grasp why those chains were lying there while I was standing here breathing.
Q: Why did you choose to depict screws and people as “two beings separated by a single sheet of paper”?
A: I think the distance between a screw and a person is made of an unimaginably long stretch of time. Manga, to me, is a medium that can summon such vast time onto a single page. And zines make that process accessible and immediate. That’s why I wanted to make this piece in that format.
Q: What do you hope visitors will carry away from this exhibition?
A: Out of all the images on view, I hope there’s one drawing that stays with them something they tuck into memory and take home.
Q: Last question: is drawing, for you, a way of explaining something, or a way of avoiding explanation?
A: It’s a language I chose so that I don’t have to explain. I don’t mind if my intentions are misunderstood or not understood at all. Please feel free to misunderstand. Thank you.
Artist
박새한 Saehan Parc (b.1989)
박새한의 작업은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 이름 붙여지지 않은 사물들, 관계의 틈에서 발생하는 작은 오해들에서 출발한다. 타원형 인물과 얇은 펜선, 최소한의 색감으로 구성된 장면들은 조용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며, 사물과 인간의 경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Saehan Parc’s work begins with scenes that resist understanding, unnamed objects, and the subtle misunderstandings that emerge in the gaps between relationships. Her oval-headed figures, fine pen lines, and restrained color palette create quiet yet resonant images that invite viewers to reconsider the boundary between people and things.
cv
Click︎︎︎
◻︎ Artist:
박새한 Saehan Parc @saehan_parc
◻︎ Photography :
고정균 Jungkyun Goh
◻︎ Graphic Design:
모닥불 Modakbool
◻︎ Text / Q&A :
김채송 Chaesong Kim_pokettales director
박새한 Saehan Parc
박새한 Saehan Parc
© 2025. SAEHAN PARC. All rights reserved.